2015. 04. 08. 수요일
뒤통수
몇 달 전 일이다.
친구, 지인들에게 취재와 관련된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했다. 말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시행 예정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미리 묻는 차원이었다. 실제 인터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생각이었기에 이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불쑥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넌 기사 ‘와꾸’(틀)를 미리 짜놓고 묻잖아…”
질문도 던지기 전 날아온 ‘핵직구’에 ‘빡친’ 나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마주하지 않았다. 친구의 말은 사실일까? 이 질문에 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답하고 싶다.
아이템이 기사가 되는 과정은 대개 이렇다.

기자가 어떤 현상이나 정황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의구심이 기사화하기 가능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사전 취재를 시작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뒤지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템이 기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것으로 판단되면 기자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간다. 기자 개인의 생각을 여론으로 봐도 무방한지 혹은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기자는 기사의 방향을 정한다. 기자가 ‘단통법’을 아이템으로 정하고 이에 찬반 여부를 취재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사전 취재를 해보니 단통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물론 한편에는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의 DB를 확인해 본다. 기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여기서 기자는 한 쪽에 치우지지 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단통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우치지 않은 질문이다.
“단통법이 시행된다는데 소비자로서 속상하시죠? 반대하시나요?”
치우친 질문이다. 치우치지 않은 질문을 던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정석이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찬반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대부분의 취재원들은 기사의 방향과 일치하는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다. 기자는 이러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여론으로 가시화하고 관련 DB와 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인다. 물론 찬성하는 쪽 의견도 담는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아이템을 취재할 때에는 늘 ‘맨 땅에 헤딩’이다. 특히 어떤 사안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을 취재에 쏟아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기자가 한 쪽에 쏠려 있어 ‘표적 취재’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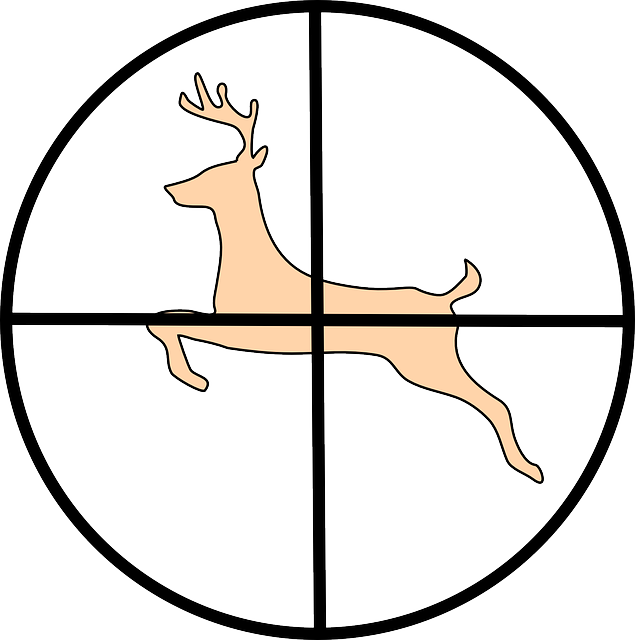
나는 과거 한 기자가 ‘표적 취재’로 기사를 만드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그 기자의 먹잇감은 ‘노인요양원 시설’이었다. 이 기자는 ‘노인요양원 시설이 A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를 기사에 담기 위해 대립하던 양측, 주민과 요양원 측을 만나 인터뷰했다.
주민들은 요양원 입주를 강력히 반대했다. 기자는 이들의 입장에 섰다. 한풀이에 가까웠던 인터뷰 내용이 기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와꾸’에 따라 알맞게 각색됐다. 기자는 요양원 측 관계자를 만나서는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데 치중하며 그들의 해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당연히 기사는 ‘요양원 입주를 반대 한다’는 뉘앙스로 실렸다.
기자가 개인의 생각을 지나치게 밀어붙일 때 기사는 ‘만들어’ 진다. 아이템이 자신의 생각대로 취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기자는 과감히 방향을 틀거나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기자는 취재한 것이 아까워 혹은 데스크의 기사 압박 등의 이유로 자신의 ‘새끼’ 같은 아이템을 놔주지 못하고 주작한다. 우리끼리는 ‘소설을 쓴다’고 한다. 그 결과는 작게는 오보, 크게는 여론 선동이다.
기자 개인이 이런 ‘주작’을 일삼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것은, 기레기 데스크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뽑아낼 때다. 이때, 데스크의 개인적인 생각이 여론으로 둔갑한다.
“OOO 국회의원이 궁지에 몰리도록 기사를 쓰란 말이야!”
“OOO당이 내놓은 이번 정책 있잖아. 그거 시민들이 옹호하고 있다는 기사 하나 만들어 봐!”
“OOO 기업 문제가 많아. 조져!”
기레기 데스크의 업무 지시는 대체로 이런 식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때 친구였던 그 놈이 이죽거리며 비판한 ‘미리 짜 놓은 와꾸’다.
기자 나부랭이가 데스크의 막중한 책임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업무지시는 정말 ‘개뜬금’ 없다. 특히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이름을 콕콕 집어 놓기만 하고 기자가 알아서 문젯거리를 찾아내라는 식의 지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 좋다. 백번 양보해 부하 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탑재, 시발 좆같아도 눈 딱 감고 해준다 치자. 그렇다면 그런 지시를 내리는 이유라도 알려줘야 할 것 아닌가. 하지만 기레기 데스크들은 그저 막무가내다. 고압적인 태도로 일방적 명령을 하달한다. 소통과 협의? 그딴 것 없다.
무소통 데스크의 전형 마부장
출처 - tvn <미생>
나름 제대로 된 언론사에 있을 때에는 기사의 몇 문장을 놓고도 데스크와 치열하고 건강한 논쟁을 펼쳤다. 당시 그곳은 ‘누가 뭐래도 취재를 직접 한 기자가 기사 내용에 대해 제일 잘 안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데스크도 그 자리에서 쥐었던 펜을 놓았다.
그런데 기레기 데스크들이 무수한 언론사들에 산재하기 시작하면서 기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바뀌고 있다. 그것도 직접 취재한 기자의 동의도 없이 말이다. 이는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차원의 ‘데스킹’ 개념이 아니다. ‘기사 강간’이다.
현장 경험이 다소 부족하거나 이상한 루트(기자 출신이 아닌)로 ‘데스크 배지’를 단 이들은 70~80년대 맞춤법을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비문 일색으로 기사를 고친다. 이렇게 엉망이 된 기사들은 대부분 교열을 통해 다시 고쳐지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냥 지면에 실린다. 엉망 기사가 그대로 지면과 인터넷에 게재되면 쪽팔린 사람은 결국 그 기사를 쓴 기자다.

데스크는 바쁘다(일부는 바쁜 척을 하는 것 같다). 기자들이 쓴 기사 신경 써야지, 매출 신경 써야지, 윗선에 아부도 해야지, 밥 먹고 낮잠도 자야한다. 그들의 노고(?), 기꺼이 치하한다.
다만, 이들이 부하 기자들의 바른 소리를 개무시하고 전혀 개선의 태도를 가지지 않는 점은 참 아쉽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니다.
‘진짜’ 데스크와 기레기 데스크는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대형 이슈가 터졌을 때 판별 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가정하자. ‘진짜’ 데스크는 이 사고를 어떻게 취재할지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다. 그리고 어떤 기자를 어느 현장에 보낼지 고민하고 자신 역시 기자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사고에 매달린다.
하지만 기레기 데스크는 말 그대로 ‘노답’이다. 큰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그저 취재기자들에게
“무조건 단독 따와라”
“낙종하면 안 돼”
라고 닦달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 때 양산된 기레기 기자들의 ‘쓰레기사’들은 이런 압박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당시 기자들은 등교하는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감정을 묻는 인터뷰를 시도했다. 한 기자가 인터뷰에 성공했다 싶으면 그 주위를 인공위성처럼 떠돌던 다른 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녹음하고 수첩에 적었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 그런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당시 모 방송국 앵커와 생존 학생의 인터뷰
뒤늦게 기자들은 학생들 사진을 멀리서 찍겠다고 합의하고 인터뷰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기사가 쏟아진 뒤였기에 이런 합의가 가능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몇몇 기자는 이 룰을 깼다. 위에서 어떤 압박을 받았을지 이해는 됐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참 불편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기자도 한낱 직장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레기 데스크의 ‘까라면 까’ 지시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데스크 역시 그 위의 지시를 그대로 기자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냥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기레기 데스크가 기레기 기자를 만든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진짜 데스크가 진짜 기자를 만든다’이다. 과열되다 못해 폭발 직전인 취재 경쟁 속에서 한 기자의 ‘자극적인 기사’는 다른 기자의 ‘보다 심한 자극 기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
‘자정’(自淨)하지 않으면 ‘자정’(自停. 스스로 멈출 것)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지만 우리는 안다. 웬만해선 작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것을…
그래도 바위에 계란을 던져보는 편이 낫다. 부서지지 않더라도 더럽게는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지난 기사 |
딴지는 전, 현직 기자들이 내부 사정상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환영하는 바이다. 속에 쌓아놓고 살면 병 난다. 철저한 보안을 약속드리니 빡치는 일이 있으면 투고하시라.
ddanzi.news@gmail.com |
뒤통수
편집 : 딴지일보 cocoa

![[문화]무도 식스맨: 독이 든 성배는 어쨌든 졸라 아프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90/029/004/200x126.crop.jpg)
추천
[문화]무도 식스맨: 독이 든 성배는 어쨌든 졸라 아프다 잘은모름![[사회]어느 기자의 폭로: 갑질 욕하는 언론사의 갑질](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97/029/004/200x126.crop.jpg) [사회]어느 기자의 폭로: 갑질 욕하는 언론사의 갑질
밝을성
[사회]어느 기자의 폭로: 갑질 욕하는 언론사의 갑질
밝을성
![[파토의 쿡 찍어 푸욱]30.인간으로 살기 위한 대가](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12/029/004/200x126.crop.jpg)
추천
[파토의 쿡 찍어 푸욱]30.인간으로 살기 위한 대가 파토![[문화]리얼리티 쇼가 미국에서 인기있는 이유](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34/025/004/200x126.crop.jpg)
추천
[문화]리얼리티 쇼가 미국에서 인기있는 이유 晶![[국제]동남아에서 살아보자1: 교민사회와 언어](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45/024/004/200x126.crop.jpg) [국제]동남아에서 살아보자1: 교민사회와 언어
깊은생각
[국제]동남아에서 살아보자1: 교민사회와 언어
깊은생각
![[사회]이 시대의 계백을 위하여 7 : 결혼해선 안 될 놈이 있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13/025/004/200x126.crop.jpg)
추천
[사회]이 시대의 계백을 위하여 7 : 결혼해선 안 될 놈이 있다 펜더![[국제]프랑스라는 이름의 파라다이스14 : 벼룩시장에서 보물찾기](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14/019/004/200x126.crop.jpg) [국제]프랑스라는 이름의 파라다이스14 : 벼룩시장에서 보물찾기
아까이 소라
[국제]프랑스라는 이름의 파라다이스14 : 벼룩시장에서 보물찾기
아까이 소라
![[국제]시드니 택시기사의 일기8: 남자가 호주에서 이혼하면 좋 된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77/018/004/200x126.crop.jpg)
추천
[국제]시드니 택시기사의 일기8: 남자가 호주에서 이혼하면 좋 된다 sydney![[사회]기레기 보고서 3 :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590/018/004/200x126.crop.jpg)
추천
» [사회]기레기 보고서 3 :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뒤통수![[문화]알고나 마시자 - 세븐브로이 M&W 그리고 사이더](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60/011/004/200x126.crop.jpg) [문화]알고나 마시자 - 세븐브로이 M&W 그리고 사이더
Anyone
[문화]알고나 마시자 - 세븐브로이 M&W 그리고 사이더
Anyone
![[의학]치과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들2 - 잇몸 치료와 치료계획](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25/012/004/200x126.crop.jpg)
추천
[의학]치과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들2 - 잇몸 치료와 치료계획 바람인형![[정치]이성과 직관 사이의 이데올로기(feat.김무성,홍준표) - intro](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46/011/004/200x126.crop.jpg) [정치]이성과 직관 사이의 이데올로기(feat.김무성,홍준표) - intro
도비공
[정치]이성과 직관 사이의 이데올로기(feat.김무성,홍준표) - intro
도비공
![[칼럼]경제와의 전쟁1 - 성장에 대한 착각과 집착](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25/011/004/200x126.crop.jpg) [칼럼]경제와의 전쟁1 - 성장에 대한 착각과 집착
K리S
[칼럼]경제와의 전쟁1 - 성장에 대한 착각과 집착
K리S
![[벙커1특강] 채사장 특강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32/007/004/200x126.crop.jpg) [벙커1특강] 채사장 특강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BUNKER1
[벙커1특강] 채사장 특강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BUNKER1
![[좌린스케치]안산-광화문 1박2일 도보행진 동행기](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58/007/004/200x126.crop.jpg) [좌린스케치]안산-광화문 1박2일 도보행진 동행기
좌린
[좌린스케치]안산-광화문 1박2일 도보행진 동행기
좌린
![[악당특집]무서운 넘들이 몰려온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111/004/004/200x126.crop.jpg)
추천
[악당특집]무서운 넘들이 몰려온다 cocoa![[사회]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대학교 학과 통폐합](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035/004/004/200x126.crop.jpg) [사회]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대학교 학과 통폐합
락기
[사회]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대학교 학과 통폐합
락기
![[국제]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 12 : 3차 산업혁명](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51/004/004/200x126.crop.jpg) [국제]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 12 : 3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국제]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 12 : 3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딴지만평]질풍노도의 새누리 사춘기 반항소년](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45/992/003/200x126.crop.jpg) [딴지만평]질풍노도의 새누리 사춘기 반항소년
공구
[딴지만평]질풍노도의 새누리 사춘기 반항소년
공구
![[딴지라디오]과이언맨 20회: 카페사장 김현진과 건물주 김태용](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09/993/003/200x126.crop.jpg) [딴지라디오]과이언맨 20회: 카페사장 김현진과 건물주 김태용
딴지라디오
[딴지라디오]과이언맨 20회: 카페사장 김현진과 건물주 김태용
딴지라디오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