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쟁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진영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구권은 냉전에 들어가게 된다. 냉전이라고 해서 서로 노려보고 싸울 준비만 했던 건 아니다. 서로의 체제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온갖 분야에서의 경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이 양국의 자존심을 걸고 덤벼든 것이 바로 ‘우주’였다. 우주에 사람을 보내고,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자체는 과학기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는 필승 카드였다(우주 발사용 로켓은 그 자체로 대륙간탄도탄 기술의 개발이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게 양국의 에이스들이다.
미국은 페이퍼 클립 작전(Operation Paperclip)으로 나치 과학자들을 쇼핑했는데, 이 페이퍼 클립 작전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분류된 게 바로 V-2 로켓 팀이었다. V-2 로켓을 개발한 베르너 폰브라운(Wernher von Braun)과 그 연구팀 100여 명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건너간 거였다.
나치 친위대 장교 출신인 폰 브라운은 패전이 임박한 시절에 자료와 V-2 로켓, 그리고 자신의 팀을 통째로 묶어서 소련이 아니라 미국 측으로 항복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그리고 미군이 오자 자신들을 통째로 넘겼다.
(페이퍼 클립 작전은 나치 친위대 출신이든 친 나치 성향이든 가리지 않고, 미국에게 쓸모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생리, 의학, 로켓, 무기 등등 수많은 분야의 과학자나 학자들을 포섭해서 미국으로 데려가는 작전이었다. CIA의 전신인 OSS가 실행한 작전으로 700여 명의 인물들을 미국으로 빼돌렸다. 원래 같았으면 전범재판에 회부될 인물들이었으나 미국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전범재판 명단에서 이들을 빼냈기에 이들은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미국에게 있어서 나치 전범의 꼬리표는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했던 거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됐다)

폰 브라운은 소련과 미국 모두가 탐내하던 과학자였다. 보복 무기로 불렸던 V-2 로켓은 런던을 목표로 날아올라서 떨어졌다. V-1 로켓이 오늘날의 순항 미사일의 전신이라면, V-2 로켓은 탄도미사일의 원형이었다. V-1의 경우는 어찌어찌 요격이 가능했다. 스핏 파이어가 날아올라 격추시킬 확률도 있었고, 대공포로 요격도 가능했다. VT 신관이 영국에 도입되고 나서는 극적으로 격추 성공률이 올라갔다. 그러나 V-1 은 달랐다 하늘에서 마하 4, 5의 속도로 내리 꽂히는 탄도 미사일은 그저 맥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소련은 어떻게 됐을까? 폰 브라운을 놓쳤다고 맥 놓고 앉아 있어야 했을까?
소련군은 V-2 로켓의 연구소가 있었던 페네뮌데(Peenemünde)로 밀고 들어가 남아있는 기술자나 V-2 로켓 부품들을 모조리 훑어갔다. 그리고 이걸 복제해 만든 것이 소련의 R-1이었고, 이 R-1을 개량한 것이 스커드 미사일이 된다. 북한의 노동, 대포동 미사일은 이 스커드를 개량한 미사일들이다. 폰 브라운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겠는가? 건더기가 아니라 국물을 훑어갔는데도 이 정도 성과가 나온 거다. 이때 이 국물들을 가지고 새로운 육수를 뽑아낸 이가 바로 소련 우주개척의 영웅 세르게이 코롤료프(Sergei P. Korolev)였다.

세르게이 코롤료프는 그가 죽기 전까지는 ‘기밀’ 그 자체였다. 그는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의 절반 이하를 가지고, 최초의 인공위성, 유인 우주선 발사, 우주 유영 등등의 수많은 성과를 일궈낸 인물이다. 그가 죽고 나서야 소련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는 스푸트니크(Sputnik : 러시아어로 '동반자'라는 뜻) 호의 개발과 발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라면 확 와닿을 거다.
다들 알다시피 미소 우주전쟁의 초반 우위는 소련이 가지고 있었다. 1957년 10월 4일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다. 이듬해 1월 4일 소멸될 때까지 스푸트니크 호는 지구 궤도 위를 돌면서 자신만의 신호 전파를 발신하였다. 전 세계는 충격과 공포, 환희와 격정으로 뒤범벅이 됐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지금은 인공위성이지만, 다음번엔 핵탄두가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원초적 공포와 함께 세계 제일은 미국인데, 어째서 인공위성은 소련이 먼저 쏘아 올렸는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미국은 교육부터 시작해(물리학과 수학 등등 근본적인 과학 교육부터 뜯어고치게 된다) 군사,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소련은 희희낙락 우주개발의 다음 행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그제야 폰 브라운을 전면에 내세우게 됐다. 1958년 1월 31일 폰 브라운은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게 된다. 대성공이었다. 폰 브라운은 순식간에 미국의 저명인사가 됐지만, 동시에 놀림감이 됐다.
당시 코미디언 모트 살(Mort sahl)은
“별에 가려고 했는데, 가끔은 런던에 떨어졌어요.”
라면서 폰 브라운이 v-2 로켓을 만 든 걸 비아냥댔고, 가수였던 톰 레러(tom lehrer)는
“일단 로켓이 발사되면 어디로 떨어지는지 누가 신경 쓰나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랍니다.”
라며 역시 폰 브라운을 공격했다.

결정타는 스텐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다. 이 영화에서 한쪽 팔을 치켜드는 나치식 경례를 하던 스트레인지러브 박사의 모델이 바로 폰 브라운 박사였다. 미국 대중문화계 사람들이 폰 브라운을 비아냥 된 것과 정 반대로 미국 정부에게 폰 브라운 박사는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됐다.
소련과 우주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폰 브라운을 쫓아낼 순 없었다. 아니,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극진히(!) 모셔야 했다. 당시 미국은 우주경쟁을 일종의 체제 경쟁, 또 다른 전쟁이라 생각했다. 1966년 연방예산의 5.5%를 NASA에 투입할 정도였다. 폰 브라운은 위기에 처한 미국을 구해내야 하는 영웅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영웅의 역할을 해냈다.
로켓 속의 원숭이
문제는 달로 사람을 보내기 전에는 최소한의 ‘실험 단계’가 필요했다. 바로 사람이 우주에서 살 수 있냐는 문제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우주개발 스케줄이 있지만, 이 단계는 똑같았다. 그 단계란,
① 지구 궤도상에 인공위성 발사
② 지구 궤도상에 생명체 발사. 우주에서의 생명활동 확인
③ 지구 궤도상에 생명체 발사. 지구로의 무사귀환
④ 지구 궤도상에 인간을 발사. 지구로의 무사귀환
4단계까지 무사히 끝내야지만, ‘달’을 목표로 한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문제는 1단계 지구 궤도상에 인공위성을 올려놓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다음 행보인 지구 궤도상에 생명체를 어떻게 올려놓느냐는 것이다. 생명체를 올려놓고 얼마만큼 생존을 시킬 것인지, 그 이전에 과연 ‘어떤’ 생명체를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놔야 할지부터 결정해야 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런 동물 실험을 먼저 시작한 건 미국이었다.
1948년 미국은 노획한 V-2 로켓에 동물을 태운 다음(태웠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물을 ‘탑재’ 했다는 게 맞는 표현 같다) 그대로 쏘아 올렸다. 최초의 동물 우주 비행사라고 해야 할까? 이때 미국이 점찍은 동물은 바로 원숭이. 그것도 뱅골 원숭이였던 ‘알버트’였다. 이 최초의 동물 우주비행사는 아무런 생명유지 장치도 없었고, 태운다는 개념도 아니었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죽었다. 이후 10년간 7번의 동물 우주 비행사를 쏘아 올렸지만, 단 한 마디로 살려서 귀환시키지 못했다.

반면에 소련은 달랐다. 기술적인 우열의 차이도 있지만, 동물 선택부터 달랐다. 미국은 곧 죽어도 원숭이였지만, 소련은 우직하게 ‘개’만을 선택했다. 말 그대로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고 해야 할까?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원숭이와 개를 선택한 각자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역시나 국가의 특성과 성격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
원숭이를 선택한 미국의 속내는 좀 복잡했다.
“동물실험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건 사람을 쏘아 올리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과 가장 유사한 생명체를 쏘아 올리는 게 맞다. 그리고 침팬지나 유인원들은 훈련만 좀 시키면 기계조작도 가능할 거다. 그럼 우주에서의 실험이나 조작도 가능할 거다!”
실제로 미국은 원숭이 20마리를 선발한 다음 45명의 수의사와 전문가를 동원해 원숭이들을 훈련시켰다. 임무를 내려서 성공하면 사탕을 주고, 실패하면 전기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원숭이들을 훈련시켰다. 반면 소련 생각은 단순하고 강렬했다.
“동물실험하는 이유가 뭔가? 극한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아닌가? 개는 원숭이에 비해 적응성이 뛰어나고,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우주란 극한 상황에서는 적응력이 우선돼야 한다.”
미국은 동물실험에서 ‘조작’이란 미션을 하나 더 넣었지만, 소련은 단순했다. 극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다. 그렇게 소련은 ‘강인한 개’를 준비하게 된다.
 한국과 칠레 사이: 문화적 고아로 살기
민원정
한국과 칠레 사이: 문화적 고아로 살기
민원정
![[딴지만평]자판기](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517/584/668/200x126.crop.jpg) [딴지만평]자판기
zziziree
[딴지만평]자판기
zziziree
![[탐사]노량진 블루스 3(完) : 500만 원짜리 식사](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26/549/668/200x126.crop.jpg) [탐사]노량진 블루스 3(完) : 500만 원짜리 식사
근육병아리
[탐사]노량진 블루스 3(完) : 500만 원짜리 식사
근육병아리

추천
우리는 왜 활에 집착하는가 1 : 원거리 투사무기의 대표주자 펜더 승리호의 신파 : 88 올림픽 호돌이 대정신의 구현
빵꾼
승리호의 신파 : 88 올림픽 호돌이 대정신의 구현
빵꾼

추천
필리핀에서 사기당하는 법 2(完): 사기꾼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벼랑끝.. 치매일기 5: 행동교정, 행동변화, 위생, 반응
zziziree
치매일기 5: 행동교정, 행동변화, 위생, 반응
zziziree

추천
승리호의 승리 : 한국식 신파가 뭐 어때서 그럴껄 영국 브리핑 10: 외신으로 본 2020 대한민국
BRYAN
영국 브리핑 10: 외신으로 본 2020 대한민국
BRYAN
![[딴지만평]백기완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23/961/667/200x126.crop.jpg) [딴지만평]백기완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zziziree
[딴지만평]백기완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zziziree
 인천 친딸 살인사건의 의문들 2(完): 이름 없는 아이들이 죽지 않으려면
임권산
인천 친딸 살인사건의 의문들 2(完): 이름 없는 아이들이 죽지 않으려면
임권산
 인천 친딸 살인사건의 의문들 1: 이름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임권산
인천 친딸 살인사건의 의문들 1: 이름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임권산

추천
프랑스 브리핑 6 : 한일해저터널의 미래, 프랑스는 어땠나? 토낍 » 국방 브리핑 45: 냉전에 희생된 강아지들 1
펜더
» 국방 브리핑 45: 냉전에 희생된 강아지들 1
펜더
![[수기]노가다 칸타빌레 45 : 아빠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091/931/666/200x126.crop.jpg) [수기]노가다 칸타빌레 45 : 아빠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꼬마목수
[수기]노가다 칸타빌레 45 : 아빠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꼬마목수
 치매일기 4:야행성, 꾀, 행동의 패턴화
zziziree
치매일기 4:야행성, 꾀, 행동의 패턴화
zzizi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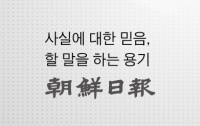
추천
마사오의 기사 실명제 : 쌉소리 기자를 찾아서 마사오
추천
필리핀에서 사기당하는 법 1: 한국인 은퇴자, 비극의 서막 벼랑끝..
추천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한국 최초의 탄핵과 임성근 판사의 앞날 헤르메스 아이 인생 이모작, 집 짓는 여자 9: 민원열전 - 막가파형
집 짓는 여자
인생 이모작, 집 짓는 여자 9: 민원열전 - 막가파형
집 짓는 여자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