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학생들이 모여 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각을 씹고 있는데 누군가 술 담긴 막걸리 잔을 던져 버린다. 이 막걸리 테러를 자행한 건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다. “니들이 뭔데 감히 김성수 선생을 씹고 지랄이야? 여자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담배나 피우는 주제에.”
하지만 막걸리를 뒤집어 쓴 불교 학생회 76학번 여학생은 “자기 앞에 놓인 술잔에 막걸리를 따르더니 옆 테이블로 조용히 다가가서 술잔을 던진 남학생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막걸리를 들이부었다. 마치 거룩한 세례 의식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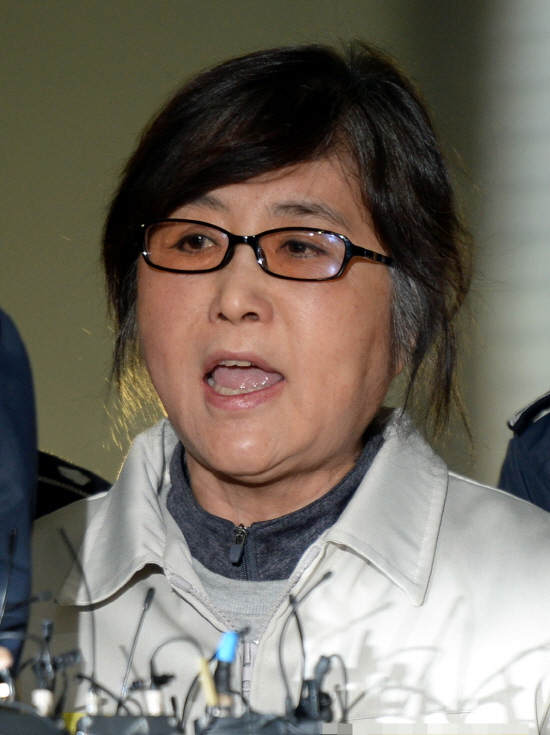


![[필독칼럼]독재정권의 눈엣가시, 의학박사 소아과 전문의 출신, 그리고 최고의 브라질 축구선수였던 남자 소크라테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94/890/198/200x126.crop.jpg)
추천
[필독칼럼]독재정권의 눈엣가시, 의학박사 소아과 전문의 출신, 그리고 최고의 브라질 축구선수였던 남... 필독![[의학]나의 정신병동 답사기 - Case 02. 1000대의 자동차와 섹스를 즐긴 사나이(上)](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96/936/198/200x126.crop.jpg) [의학]나의 정신병동 답사기 - Case 02. 1000대의 자동차와 섹스를 즐긴 사나이(上)
drksj
[의학]나의 정신병동 답사기 - Case 02. 1000대의 자동차와 섹스를 즐긴 사나이(上)
drksj
![[딴지만평]가을타는 정은이(feat.미사일)](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04/908/198/200x126.crop.jpg) [딴지만평]가을타는 정은이(feat.미사일)
zziziree
[딴지만평]가을타는 정은이(feat.미사일)
zziziree
![[세계사]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5부 1 - B-29, 지옥이 시작된 일본](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42/787/198/200x126.crop.jpg)
추천
[세계사]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5부 1 - B-29, 지옥이 시작된 일본 펜더![[국제]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임 시위 : 카라카스는 왜 불타는가 2](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73/659/198/200x126.crop.jpg) [국제]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임 시위 : 카라카스는 왜 불타는가 2
SamuelSeong
[국제]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임 시위 : 카라카스는 왜 불타는가 2
SamuelSeong
![[산하의 오책]'영초 언니' 잊혀진 밀알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11/785/198/200x126.crop.jpg) » [산하의 오책]'영초 언니' 잊혀진 밀알들
산하
» [산하의 오책]'영초 언니' 잊혀진 밀알들
산하
![[범우시선]연결](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047/648/198/200x126.crop.jpg) [범우시선]연결
범우
[범우시선]연결
범우
![[기획]나는 조금 특별한, 교도소에서 일합니다7 : 여기선 인간적인 게 제일 위험하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28/317/197/200x126.crop.jpg) [기획]나는 조금 특별한, 교도소에서 일합니다7 : 여기선 인간적인 게 제일 위험하다
Boss
[기획]나는 조금 특별한, 교도소에서 일합니다7 : 여기선 인간적인 게 제일 위험하다
Boss
![[업무편람]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번외) : 우리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일까?](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15/085/198/200x126.crop.jpg) [업무편람]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번외) : 우리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일까?
워크홀릭
[업무편람]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번외) : 우리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일까?
워크홀릭
![[모험]딴지일보 기자의 토익스피킹 만점 도전기(feat.독학) - 1. 프롤로그](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82/358/198/200x126.crop.jpg)
추천
[모험]딴지일보 기자의 토익스피킹 만점 도전기(feat.독학) - 1. 프롤로그 인지니어스![[교육]영어 교육 논쟁에 관하여 : 지 조때로 하면 된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28/362/198/200x126.crop.jpg)
추천
[교육]영어 교육 논쟁에 관하여 : 지 조때로 하면 된다 CZT![[산하칼럼]공범자들 : 언론을 질식시키고 타락시키는 악질 주범들의 이야기](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66/361/198/200x126.crop.jpg) [산하칼럼]공범자들 : 언론을 질식시키고 타락시키는 악질 주범들의 이야기
산하
[산하칼럼]공범자들 : 언론을 질식시키고 타락시키는 악질 주범들의 이야기
산하
![[교육]영어마비 재활프로젝트 - 듣기, 읽기, 말하기(초급자용)](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00/931/197/200x126.crop.jpg) [교육]영어마비 재활프로젝트 - 듣기, 읽기, 말하기(초급자용)
Nerdy
[교육]영어마비 재활프로젝트 - 듣기, 읽기, 말하기(초급자용)
Nerdy
![[딴지만평]유죄의 풍경(주역: 이재용)](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23/358/198/200x126.crop.jpg) [딴지만평]유죄의 풍경(주역: 이재용)
zziziree
[딴지만평]유죄의 풍경(주역: 이재용)
zziziree
![[딴지만평]한 장으로 정리하는 법원 블랙리스트 사태](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78/318/198/200x126.crop.jpg) [딴지만평]한 장으로 정리하는 법원 블랙리스트 사태
zziziree
[딴지만평]한 장으로 정리하는 법원 블랙리스트 사태
zziziree
![[군사기밀]한미연합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기념: 감옥갈 각오로 쓰는 나의 군시절 비밀임무](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126/172/198/200x126.crop.jpg)
추천
[군사기밀]한미연합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기념: 감옥갈 각오로 쓰는 나의 군시절 비밀임무 무성한그곳![[서평]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 : MB 로드를 찾아서 (feat. 돈의 신)](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083/178/198/200x126.crop.jpg) [서평]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 : MB 로드를 찾아서 (feat. 돈의 신)
cocoa
[서평]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 : MB 로드를 찾아서 (feat. 돈의 신)
cocoa
![[사회]살인사건으로 본 새로운 미디어와 한국 사회](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65/085/198/200x126.crop.jpg) [사회]살인사건으로 본 새로운 미디어와 한국 사회
알려지지 않은 주시자
[사회]살인사건으로 본 새로운 미디어와 한국 사회
알려지지 않은 주시자
![[의학]나의 정신병동 답사기 - Case 01. 애국가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52/085/198/200x126.crop.jpg) [의학]나의 정신병동 답사기 - Case 01. 애국가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drksj
[의학]나의 정신병동 답사기 - Case 01. 애국가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drksj
![[문화]한일 문화컬쳐 1 : 도쿄에 놀러온 한국 친구랑 야키니쿠를 먹으러 갔더니](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54/780/197/200x126.crop.jpg)
추천
[문화]한일 문화컬쳐 1 : 도쿄에 놀러온 한국 친구랑 야키니쿠를 먹으러 갔더니 누레 히요코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