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트는 왜 15년 간의 빈궁한 비정규직 생활에 시달렸을까. 칸트의 공부량은 엄청났고,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런데 교수가 되려면 어느 한 전공분야에서 특출나다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 칸트의 야심은 철학에 있었지만 그는 아직 철학에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다재다능'과 '박학다식'은 고용주 측에서 이리저리 써먹기 좋은 조건이지 당사자가 교수 임명장을 받기에는 불리하다. 또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평생직인지라 자리가 나려면 전임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해야 한다. 칸트가 대학 교수직을 갈망하는 오랜 세월 동안 전임자들은 무척 건강했다.
칸트가 지치고도 남았을 때쯤, 드디어 정교수직의 기회가 왔다. 칸트가 하는 강의의 명성은 전국적인 수준을 넘어 국제적이었다. 그의 정규직 취직은 프로이센의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프로이센의 문교부가 나섰다. 그런데 문교부 장관이 제안한 자리는 할레 대학교의 문학부 교수였다. 뜬금없이 웬 문학이란 말인가?
정부 관료들은 모든 분야에서 명강의를 구사하는 비결을 칸트의 언어적 재능으로 판단했다. 말솜씨가 아닌 엄청난 학습량과 암기력의 결과지만 두개골 안쪽은 남의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칸트는 거절했다. 그가 하고 싶은 건 철학이었다. 거절의 대가로 여전히 곤궁한 생활이 남았다. 남은 선택지는 투잡이었다. 칸트는 강사를 겸하면서 마흔 두 살에 쾨니히스베르크의 왕립 도서관 사서로 취직했다.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1770년, 드디어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에 철학교 정교수 자리가 났다. 칸트는 46세가 되어서야 꿈에 그리던 정규직이 되었다. 저축도 이때부터 가능했다. 그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때는 14년 후, 나이 60세가 되어서다.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강의지옥은 한층 더 심해졌다. 칸트의 강의는 모두가 인기 폭발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의 사랑을 받은 과목은 세계지리였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칸트는 평생 쾨니히스베르크 반경 30km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는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망했다. 이 도시의 지박령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다. 그러나 엄청난 암기력으로 외국 도시의 다리를 나사 갯수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칸트는 강의에 강의가 이어지는 나날에 질력을 냈다.
“나는 날마다 내 교탁의 귀퉁이에 앉아서 무거운 망치를 두들기는 것과 비슷한 강의들을 단조로운 박자로 계속 진행해 나갔다.”
학생들의 평가는 정반대다. “해학과 재치, 밝은 분위기”, “유쾌한 만남의 시간”, “기분 좋게 이끌어 준다”, “부드럽게 강요한다”, “눈과 귀를 떼어낼 수 없다”. “정말로 재밌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군대의 격언이 다시 생각난다.
<중간만 해라>
칸트의 전반생은 생활고, 후반생은 강의지옥으로 정리된다. 당연히 자신의 철학을 집대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1781년, 칸트는 드디어 자신의 철학의 집대성이자 대표작 그리고 3대 비판서의 첫 번째인 <순수이성비판>을 출간했다. 이때 그의 나이 57세. 집필에 십년 가까이가 걸린 대작이었다.

칸트의 친구는 저자에게 분노의 편지를 보냈다.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꼽는 중인데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일세.”
제자인 요한 헤르더는 하소연했다,
“교수님 지금 반 쯤 읽었는데 더 읽다가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같은 전문가끼리도 추천할 책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철학자인 멘델스존마저도 분노를 터뜨렸다.
“신경쇠약을 유발한다.”
“젊은 기질을 망친다.”
그렇다, 이 책은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순수이성비판> 완독은 고문에 가까우며 독서라기보다는 자해라고 부르는 편이 옳다. 글쓴이의 경우처럼 교양이 함양되기는커녕 성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무작정 재미가 없으면 잠이라도 올 것을, 무언가 대단한 게 있다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준다. 의미를 자꾸만 되뇌게 되어 있는 잠도 달아난다.
책을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들의 숫자가 모여야 주목을 받을 텐데, 이 과정이 느릴 수밖에 없었다. 책도 저자처럼 대기만성이었다. 간단히 말해 책이 잘 안 팔렸다. 출판사에서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교수님, 이번 책은 망한 거 같습니다.”
칸트는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책은 인정받을 거요.”
결국은 칸트의 말대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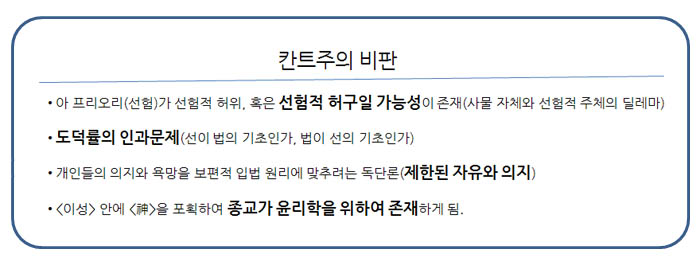
;;; ;;;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는 수많은 철학도들이 <순수이성비판> 앞에서 길을 잃은 채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칸트가 요약과 정리의 화신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칸트는 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예습과 복습을 도와주기 위해 서문을 길게 썼다. 서문이 바로 책 전체의 쉬운 요약이자 전체 내용의 계획서다. 이것만 읽어도 이해가 가능하다.
칸트의 3대 비판서가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상비판>, <판단력비판>이다. 각각 존재론(인식론), 윤리학, 미학이다. 철학의 전개 순서를 완전히 정립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서문이다.
<판단력비판> 초판 서문은 3대 비판서의 요약판으로 철학도들의 보물이다. ‘지난 이야기’에 ‘이번 편 스포일러’를 합쳤다. 출발 비디오여행 급의 요점정리를 자랑한다. 칸트 이전까지의 대륙 합리론과 영국 경험론의 가치와 한계도 요약되어있다.
철학도들이여, 칸트의 서문을 읽어라. 이 사람은 유명한 족집게 선생이다.
<순수이성비판>보다는 역시 지식계층과 학생들이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이 주목받았다. 이해가 가야 칭송을 할 거 아닌가. 칸트는 계몽주의에 대한 에세이를 출간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명성과 함께 <순수이성비판>이 어렵다는 원성도 커졌다. 칸트는 환갑의 나이에 자신의 철학을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한 책을 따로 쓴다.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고 하는, 웬만해선 읽기 싫은 제목을 자랑하는 이 책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라 칸트는 이중 삼중의 욕을 먹었다.
결국 <순수이성비판>을 더 쉽게 써서 재판을 내놓았다. 칸트의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원래도 쉽게 써 주었는데 어떻게 재작업을 해야 할 만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느냐고 독자들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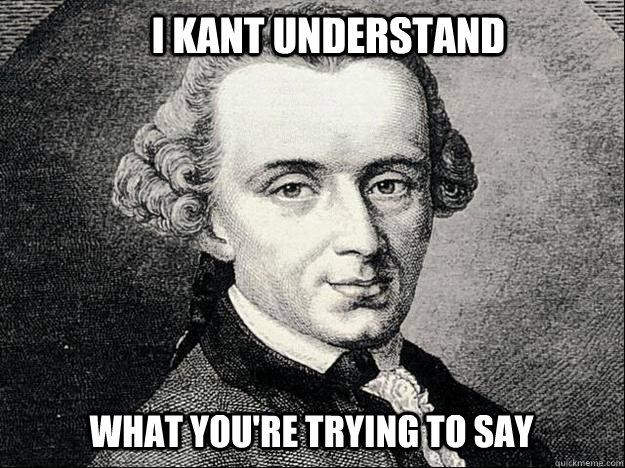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을 연달아 내 놓은 칸트는 점차 독일 전역과 유럽에서 존경받는 지식인이 되어갔다. 62세에는 쾨니히스베르크 대학 총장에 취임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후 베를린왕립학술원 회원도 되었다. 노년의 그는 쾨니히스베르크의 명물이자 자랑거리로 주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렇다면 <순수이성비판>은 대체 어떤 책인가? 아니 그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기획된 작품인가? 칸트는 서양철학의 제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형이상학자 중 하나였다. 데이비드 흄을 읽기 전까지는 말이다.
영국 경험론의 완성자 데이비드 흄, 그는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대륙 합리론을 사망 직전까지 몰아붙인 어쌔신 크리드였다. 흄을 알면 <순수이성비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편에 계속)
필자가 진행하는 방송
아이튠즈 : https://t.co/NnqYgf5443
트위터 : @namyegi
필자의 신간
필독
트위터 @field_dog
페이스북 daesun.hong.58
![[산하의 오책]NL에 대한 믿음 - NL 현대사를 읽고](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029/887/511/200x126.crop.jpg) [산하의 오책]NL에 대한 믿음 - NL 현대사를 읽고
산하
[산하의 오책]NL에 대한 믿음 - NL 현대사를 읽고
산하
![[딴지만평]좋아, 자연스러웠어](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154/233/514/200x126.crop.jpg) [딴지만평]좋아, 자연스러웠어
zziziree
[딴지만평]좋아, 자연스러웠어
zziziree
![[현장스케치]노무현 대통령 9주기 : 5월 23일, 봉하](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88/868/513/200x126.crop.jpg) [현장스케치]노무현 대통령 9주기 : 5월 23일, 봉하
미노루
[현장스케치]노무현 대통령 9주기 : 5월 23일, 봉하
미노루
![[교육]학교에서 배우는 것 : 굴복하지 않는 교육을 꿈꾸며](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61/864/513/200x126.crop.jpg) [교육]학교에서 배우는 것 : 굴복하지 않는 교육을 꿈꾸며
SickAlien
[교육]학교에서 배우는 것 : 굴복하지 않는 교육을 꿈꾸며
SickAlien
![[긴급분석]북미정상회담 취소, 새벽의 충격 3: 대화는 이어진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62/902/513/200x126.crop.jpg)
추천
[긴급분석]북미정상회담 취소, 새벽의 충격 3: 대화는 이어진다 펜더![[긴급분석]북미정상회담 취소, 새벽의 충격 2: 핑퐁](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06/891/513/200x126.crop.jpg)
추천
[긴급분석]북미정상회담 취소, 새벽의 충격 2: 핑퐁 펜더![[긴급분석]북미정상회담 취소, 새벽의 충격 1: 트럼프의 생각](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92/876/513/200x126.crop.jpg)
추천
[긴급분석]북미정상회담 취소, 새벽의 충격 1: 트럼프의 생각 펜더![[딴지만평]김정은의 폭파, 트럼프의 폭파](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497/857/513/200x126.crop.jpg) [딴지만평]김정은의 폭파, 트럼프의 폭파
zziziree
[딴지만평]김정은의 폭파, 트럼프의 폭파
zziziree
![[문학]울분에 찬 한시 : 체포안부결(剃布按斧訣) 육갑질헌다(戮甲窒獻多)](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124/674/513/200x126.crop.jpg) [문학]울분에 찬 한시 : 체포안부결(剃布按斧訣) 육갑질헌다(戮甲窒獻多)
산하
[문학]울분에 찬 한시 : 체포안부결(剃布按斧訣) 육갑질헌다(戮甲窒獻多)
산하
![[딴지만평]노짱이 구멍가게에 들렀다면](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93/650/513/200x126.crop.jpg) [딴지만평]노짱이 구멍가게에 들렀다면
zziziree
[딴지만평]노짱이 구멍가게에 들렀다면
zziziree
![[탐방]일본 체인점이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어: 2. 가스토(ガスト)](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92/631/513/200x126.crop.jpg)
추천
[탐방]일본 체인점이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어: 2. 가스토(ガスト) 누레 히요코![[정치]드루킹으로 본 보수의 수준: 조선일보, 너네도 참 별 거 없구나](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66/628/513/200x126.crop.jpg)
추천
[정치]드루킹으로 본 보수의 수준: 조선일보, 너네도 참 별 거 없구나 필독 찌라시 십자군 7 : 싱겁게 끝난 2차 십자군 전쟁
슈퍼팩토리공장장
찌라시 십자군 7 : 싱겁게 끝난 2차 십자군 전쟁
슈퍼팩토리공장장

추천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11 : 진화와 성(Sex) 갈로아![[이너뷰]루리웹 드덕스님을 만나다 : 덕질로 성불하기](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63/409/513/200x126.crop.jpg)
추천
[이너뷰]루리웹 드덕스님을 만나다 : 덕질로 성불하기 빵꾼
추천
지극히 개인적인, 물뚝심송과의 8년 죽지않는돌고래
추천
물뚝심송, 락기![[한동원의 적정관람료]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Solo: A Star Wars Story)](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558/092/513/200x126.crop.jpg) [한동원의 적정관람료]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Solo: A Star Wars Story)
한동원
[한동원의 적정관람료]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Solo: A Star Wars Story)
한동원
![[인물]다시 보는, 철학자 칸트의 삶 2 : 제왕의 길](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58/836/512/200x126.crop.jpg) » [인물]다시 보는, 철학자 칸트의 삶 2 : 제왕의 길
필독
» [인물]다시 보는, 철학자 칸트의 삶 2 : 제왕의 길
필독
![[군사비밀]프랑스 외인부대 다녀온 썰 푼다6 : 1997년 콩고 내전과 외인부대원 이라는 것](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97/683/512/200x126.crop.jpg)
추천
[군사비밀]프랑스 외인부대 다녀온 썰 푼다6 : 1997년 콩고 내전과 외인부대원 이라는 것 Massoud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