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비드 흄
데이비드 흄. 그는 <순수이성비판> 출간 5년 전에 사망한 칸트의 선배 철학자다. 스코틀랜드 사람인 흄은 영국 경험론의 완성자이지만 당대의 스타가 되기에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변방 사람이라서다.
예로부터 영국은 유럽의 시골이었고,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시골이었다. 흄의 저작은 그럭저럭 인정을 받는 수준이었다. 여기까지는 대륙 합리론 철학도 흄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흄이 파리 주재 영국 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취직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당시 파리에서는 계몽주의가 유행이었다. 파리는 유행에 민감한 도시였고 흄의 사상은 급진적인 계몽주의였다. 파리의 사교계를 관장하던 인물은 루이 15세의 정부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부인 마담 퐁파두르였다. 퐁파두르는 흄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흄은 갑자기 국제적인 명사가 되었다. 그의 스타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친구에게 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나의 생활에 대해 묻는다네. 나는 내가 암브로시아(신들이 먹는 불로불사의 약)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넥타(신들의 음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마시고, 향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이키지 않고, 꽃길 외에는 어느 길도 걷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네.”
흄의 철학이 파리를 통해 유럽 전역을 강타했다. 영국 경험론이 섬나라를 벗어나 이성주의 합리론자들의 두개골을 노크했다. 쾨니히스베르크에 있는 칸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칸트의 회고는 정직하고도 묵직하다.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내게 데이비드 흄은 이런 사람이다. 그는 내가 수년 동안 빠져 있었던 독단의 선잠에서 비로소 깨어나게 했고, 사변 철학 분야에서의 나의 연구에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데이비드 흄의 동상
흄은 경험론자이자 회의주의자답게 실용적이었다. 그는 인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돌연 파리를 떠나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나는 내게 온갖 예의를 갖추는 파리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기로 결정했다.”
유행에서 벗어나기 전에 사라지겠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흄은 전설로 남았다. 영국은 흄을 외무부 차관에 임명해 그의 명성을 외교에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신비감을 잃게 된다. 흄은 금방 사표를 내고 고향에 돌아갔다.
칸트가 빠져 있었다는 독단이란 무엇이며, 경험론과 합리론은 또 무엇인가? 이 설명을 위해 합리론과 경험론을 의인화해 창작 소설을 써 보겠다.
일단 여기서 합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사람' 등에 쓰는 표현과는 다르다. 이때의 합리는 문자 그대로 <이치에 완전히 들어맞는다>는 의미다.
이치는 보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뜻한다. 영어에서 rationalism이라고 하는데 rationale이 이성이란 뜻이다. 즉, 진리주의 혹은 이성주의다. 우주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하면 진리고, 인간에게 진리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여되면 이성이다. 그리스어로는 로고스, 산스크리트어로는 우주의 질서인 브라흐마에 해당한다. 영국 경험론은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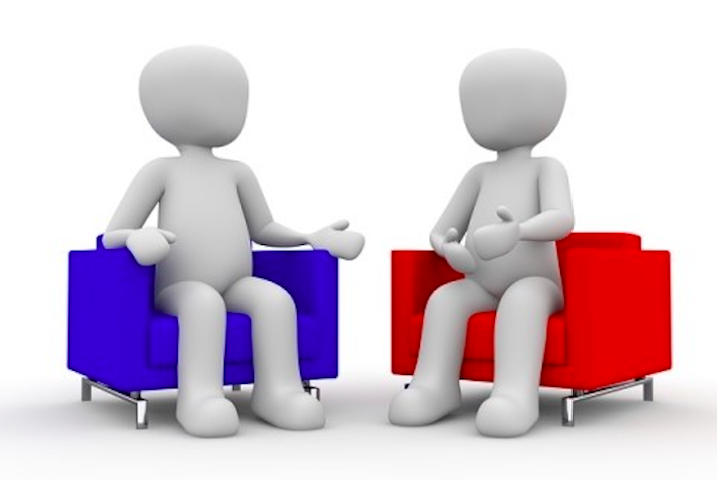
"우주의 보편적 질서? 본질적 실체? 인간의 이성? 갖고 와 봐. 눈으로 확인해 보게."
합리론은 이렇게 말한다.
"응 기다려 봐. 연역 추리로 증명해줄게. 너 거기 딱 있어. 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 의심할 수 없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 준다니까?"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경험론이 말을 쏟아낸다.
“이봐 합리론! 네 말은 수학적이고 기학적으로 신의 존재니 보편이성이니 하는 게 증명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 프로 맞는 말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수학 문제 답이 3인 이유는 공식을 대입해 풀면 3이 산출되도록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 아니야? 정답이 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유일신’, ‘로고스’가 되도록 너는 문제를 짤 뿐이잖아. 문제 풀이는 공식이고 수학적 진리여도 문제 자체는 출제자의 창작 아닌가. 네가 낸 문제 네가 풀고 순수이성이 존재하고 그게 세계의 본질이라고? 어디서 약을 팔아?"
이제 경험론은 거꾸로 합리론을 가르친다.
"뭘 자꾸 증명해. 증명하지 말고 실증을 해. 책상에 앉아서 자꾸 우주적 질서를 음미하면 그게 뿅 하고 생기니? 그건 지식이 아니라 공상이지. 우리 사조이신 베이컨 형님이 그러셨지.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란 건 말야 짜샤, 검증과 실증에 의해 가설을 벗어나 정설로 채택되는 게 지식이지."
이 태도는 경험론적 귀납법을 탄생시켰다. 과학은 귀납이다.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인식도 생기고 관념도 생겨난다. 일상의 경험이 아니라 지식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경험도 있다.
"... 이것을 ‘실증을 위한 경험’이라 하여 실험이라 한단다. 경험은 experience, 실험은 experiment라고 하거든? 왜 안 받아 적어? 어쭈 지금 영국제라고 무시하는 거야? 현실에서 반복적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란다, 합리론아. 뭐 보편타당하지 않은 건 허상이라 믿을 수 없다고? 영국에 놀러 와. 증기기관 보여줄게^^"
영국은 경험론을 토대로 과학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상처받은 합리론은 "그럴 리 없어. 현실은 불완전한 허상이야!"를 외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린다.
"나는 못 잃어. 합리 못 잃어..."
"나는 믿어. 순수이성 믿어."
여기까지가 흄이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이다.

데이비드 흄은 007살인면허를 들고 파리에 등장해 합리론을 사망 직전까지 안내했다. 흄 역시 경험론 선배들처럼 보편적 질서 따위 당연히 없거니와, 있어봐야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파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자아, 즉 '나'도 없다고 했다. 인간은 '나'가 있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이야기다.
인간이 비물질적이고 이성적인 주체이자 영혼이라고 믿는 그것. 자신, 자아, 바로 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사실 '인식의 다발' 혹은 '지각의 다발'이다(그저 번역 차이다. 혼동스러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경험이다. 그러면 인식이 생겨나고 의식으로 남는다. 의식은 생각, 기억, 취향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통해 개를 무서워하게 됐고, 어떤 꽃이 좋고, 트와이스보다 블랙핑크가 좋고...'
하나하나를 국수 가락처럼 묶어서 포장하면 다발이라고 할 수 있다. 흄이 말하는 이성은 보편적 질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이해력, 다시 말해 요즘 식으로는 지능에 불과하다. 순수이성이 없기에 이성을 담는 그릇인 자아나 영혼도 없다.
우리는 '다발'을 자신의 자아나 영혼으로 착각한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의 묶음이다. 유니콘이라는 말이 있다고 유니콘이 있는 건 아니듯, 언어에 1인칭 주어가 있다고 그게 실재하지는 않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흄의 철학은 합리론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타였다. 대륙 합리론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제1 명제를 벼랑 끝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흰 스케치북으로 태어나 외부 환경과 의지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과 같다는 사상은 급진적이다. 흄의 철학에서는 귀족적인 정신, 원래부터 이성적인 인간 따위의 구분이 없어진다. 환경과 기회가 주어져야 노력을 통해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러면 왕부터 하층민까지 인간은 모두 평등해진다. 하층민들의 무식함은 이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배울 기회가 없었던 탓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계몽주의다. 흄의 철학은 계몽주의와 직통으로 연결된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주의의 위기 속에서 등판한 구원투수다.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꾸 흄한테서 도망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그놈의 죽고 못 사는 ‘순수이성’이라는 것을 도마 위에 올려 보자! 뼈와 살을 분리해 비판을 해 보자."
비판이다. 순수이성 '비난'이 아니다. 거부하고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성의 한계와 기능을 명확히 판가름하자는 취지다. 칸트 생각에 이성은 있다. 다만 과대평가되는 게 문제다.
칸트는 경험론의 결핍과 합리론의 오류를 바로잡아 인간이 사물과 세계 그리고 인간 자신을 인식하는 철학적 메커니즘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경험론이 말하는 후천적 경험, 합리론이 붙잡아 온 선험적(선천적) 이성은 모두 인간의 지식과 판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한 줄 요약 시간이다. 그 유명한 명문장 나와 주시고.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의자의 형태를 이성으로, 나무를 경험이라 가정해 보자. 의자가 현실에 존재하려면 둘이 만나야 한다. 인간의 앎은 경험이라는 재료를 이성으로 깎아낸 결과물이다.
그럼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으로 다가오는 신체 바깥의 것들은? 인간의 감각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모든 판단의 근거를 마련한다. 일단 경험이라는 내용이 정신 안에 들어와야 선험적 이성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할 텐데, 경험은 주관적이라는 거다. 사물의 진짜 형태 - 본질을 칸트는 '물자체'라고 한다. 그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인간은 물자체엔 다가갈 수 없다.”
이것이 칸트 철학의 근본적인 고독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훗날 피히테, 셸링, 헤겔이 등장하게 된다. 헤겔은 절대정신과 접신했는지 대표작 <정신현상학>에서 내내 방언을 터뜨리는데 결코 읽지 말도록 하자. 난해한 정도가 아니라 주화입마에 빠진다. 이 책은 뇌에 붓는 독극물이다.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라.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칸트 전후로 서양철학의 역사는 바뀐다. 영국 경험론의 계승자는 많아도, 발전의 역사는 흄에서 끝난다고 봐야 한다. 이후로는 경험론이 아니라 영미철학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대륙 합리론이라는 용어도 잦아든다. 이때부터는 독일 관념론, 혹은 그냥 관념철학 내지는 대륙철학이라고 한다. <영미 vs 대륙>의 구도는 남았지만 과거의 사조는 흐름이 끝났다. 앞으로 서양 사상은 칸트의 철학을 토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상이 임마누엘 칸트가 제왕에 등극한 과정이다.
(다음 편에 계속)
필자가 진행하는 방송
아이튠즈 : https://t.co/NnqYgf5443
트위터 : @namyegi
필자의 신간
필독
트위터 @field_dog
페이스북 daesun.hong.58
![[딴지만평]모두가 No 할 때, 혼자서 Yes 할 수 있는](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93/930/515/200x126.crop.jpg) [딴지만평]모두가 No 할 때, 혼자서 Yes 할 수 있는
zziziree
[딴지만평]모두가 No 할 때, 혼자서 Yes 할 수 있는
zziziree
![[탐방]일본 체인점이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어: 3. 코코이찌방야(CoCo壱番屋)](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61/477/515/200x126.crop.jpg)
추천
[탐방]일본 체인점이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어: 3. 코코이찌방야(CoCo壱番屋) 누레 히요코![[기획]촛불세대와 뱅뱅이론: 1. 비추, 메모, 점댓글, 정치성의 일상화 (1)](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133/345/515/200x126.crop.jpg)
추천
[기획]촛불세대와 뱅뱅이론: 1. 비추, 메모, 점댓글, 정치성의 이... 춘심애비![[산하의 오책]날씨가 만든 그날의 세계사](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11/005/513/200x126.crop.jpg) [산하의 오책]날씨가 만든 그날의 세계사
산하
[산하의 오책]날씨가 만든 그날의 세계사
산하
![[기획]해보고 말하는 직업, 기자 8 - 열심히 했던 세월만큼은 비켜가지 않는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07/341/514/200x126.crop.jpg) [기획]해보고 말하는 직업, 기자 8 - 열심히 했던 세월만큼은 비켜가지 않는다
헤르매스 아이
[기획]해보고 말하는 직업, 기자 8 - 열심히 했던 세월만큼은 비켜가지 않는다
헤르매스 아이
![[딴지만평]홍준표의 빠아아아앙, 아베의 빠아아아앙](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17/300/515/200x126.crop.jpg) [딴지만평]홍준표의 빠아아아앙, 아베의 빠아아아앙
zziziree
[딴지만평]홍준표의 빠아아아앙, 아베의 빠아아아앙
zziziree
![[잡식]알아두면 쓸데없는 언어지식 4 : 인공어? 그게 뭐죠?](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010/052/514/200x126.crop.jpg) [잡식]알아두면 쓸데없는 언어지식 4 : 인공어? 그게 뭐죠?
C+
[잡식]알아두면 쓸데없는 언어지식 4 : 인공어? 그게 뭐죠?
C+

추천
『대망』으로 바라본 전국시대 5: 이익의 정치 펜더![[기획]촛불세대와 뱅뱅이론: 0. 인트로](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48/850/514/200x126.crop.jpg)
추천
[기획]촛불세대와 뱅뱅이론: 0. 인트로 춘심애비![[포토만평]아트만두의 인간대백과 사전: 전두환 그리고 양승태](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82/835/514/200x126.crop.jpg) [포토만평]아트만두의 인간대백과 사전: 전두환 그리고 양승태
아트만두
[포토만평]아트만두의 인간대백과 사전: 전두환 그리고 양승태
아트만두
![[경제]8문 8답으로 알아보는 혼돈의 카오스 이탈리아 사태](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046/757/514/200x126.crop.jpg) [경제]8문 8답으로 알아보는 혼돈의 카오스 이탈리아 사태
씻퐈
[경제]8문 8답으로 알아보는 혼돈의 카오스 이탈리아 사태
씻퐈
![[탐방]2018 봄, 일본을 불태운 대박적 축제 : 케야키 맥주 축제(Keyaki Beer Festival)](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924/744/514/200x126.crop.jpg) [탐방]2018 봄, 일본을 불태운 대박적 축제 : 케야키 맥주 축제(Keyaki Beer Fest...
누레 히요코
[탐방]2018 봄, 일본을 불태운 대박적 축제 : 케야키 맥주 축제(Keyaki Beer Fest...
누레 히요코
![[관전기]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 김문수, 압도적으로 미세해](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254/725/514/200x126.crop.jpg)
추천
[관전기]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 김문수, 압도적으로 미세해 인지니어스![[인물]다시 보는, 철학자 칸트의 삶 3 : 난세를 평정한 제왕](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754/337/514/200x126.crop.jpg) » [인물]다시 보는, 철학자 칸트의 삶 3 : 난세를 평정한 제왕
필독
» [인물]다시 보는, 철학자 칸트의 삶 3 : 난세를 평정한 제왕
필독
![[기획]한국 친구들을 위한 일본헌법 이야기12: 일본국헌법의 삼권 분립](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047/118/512/200x126.crop.jpg) [기획]한국 친구들을 위한 일본헌법 이야기12: 일본국헌법의 삼권 분립
누레 히요코
[기획]한국 친구들을 위한 일본헌법 이야기12: 일본국헌법의 삼권 분립
누레 히요코
![[기획]인문학적으로 풀어본 매춘문화사11: 본격적인 신개념 성매매에 빠져드는 조선](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77/857/512/200x126.crop.jpg)
추천
[기획]인문학적으로 풀어본 매춘문화사11: 본격적인 신개념 성매매에 빠져드는 조선 어깨걸이극락조![[기획]해보고 말하는 직업, 기자 7 - 정신 차려 보니 다시 국회 출입기자](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838/681/513/200x126.crop.jpg) [기획]해보고 말하는 직업, 기자 7 - 정신 차려 보니 다시 국회 출입기자
헤르매스 아이
[기획]해보고 말하는 직업, 기자 7 - 정신 차려 보니 다시 국회 출입기자
헤르매스 아이
![[문학]양승태를 위한 한시 : 법벌어지호로색(法閥圄志虎怒色)](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306/553/514/200x126.crop.jpg) [문학]양승태를 위한 한시 : 법벌어지호로색(法閥圄志虎怒色)
산하
[문학]양승태를 위한 한시 : 법벌어지호로색(法閥圄志虎怒色)
산하
![[딴지만평]스테이크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개정](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536/429/514/200x126.crop.jpg) [딴지만평]스테이크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개정
zziziree
[딴지만평]스테이크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개정
zziziree
![[경제]우리는 크레딧 사이클 속에 살고 있다](https://img-cdn.ddanzi.com/files/thumbnails/631/815/513/200x126.crop.jpg) [경제]우리는 크레딧 사이클 속에 살고 있다
씻퐈
[경제]우리는 크레딧 사이클 속에 살고 있다
씻퐈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